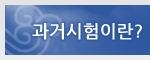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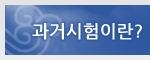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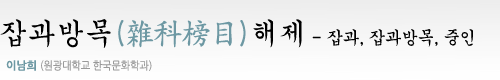 |
||||||
|
|
잡과는 전문직 중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외교관, 의사, 과학자, 법조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래서 누구나 선망하는 전문 직종에 해당한다. 그런데 불과 100여년 전만해도, 그들의 신분은 「중인」에 지나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관료이기는 했지만, 양반과 양인 사이의 중간 신분층을 구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인(中人)이라 하면 역관(譯官), 의관(醫官), 음양관(陰陽官), 율관(律官), 산원(算員), 화원(畵員), 악원(樂員) 등의 기술관뿐만 아니라 서리(胥吏), 향리(鄕吏), 서얼(庶孼) 등 포괄되는 층이 넓다. 「잡과중인」은 그 중에서도 상급 기술관으로 잡과(雜科)에 합격한 이후, 역관, 의관, 음양관, 율관으로 진출한 본인 및 혈연과 통혼 관계로 맺어져 있는 가계 구성원까지 포함하는 범주라 할 수 있다.1) 그들은 잡과합격자라는 점에서 여타의 일반 기술관들과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선발 양식의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처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잡과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곧 기술관으로서의 입지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고위직 기술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담보해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참상관(종6품 이상)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잡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이 편찬한 잡과방목 자체가 잡과중인 범주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잡과중인은 국가의 각종 행정실무와 실용기술을 담당했던 실제 운영자들이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행정실무와 실용기술을 통하여 양반 못지않은 지식과 경제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닌 직능(職能)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했으므로,2) 이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 문제화 되었다. 법규상으로는 정3품 당하관이 한품(限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는 고위 관품과 동반직을 제수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반층은 벼슬의 과도한 제수와 명분(名分)의 혼탁을 들어 심하게 반대하곤 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외교 관계를 매우 중요시 했으며 역관은 실질적인 의사소통 업무를 맡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천하의 흐름을 파악하는 임무가 역관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들이 보고하는 문견사목(聞見事目)이나 별단(別單)은 중국, 여진, 일본, 유구 등 주변 국가의 정세 파악 등에 유용한 정보의 역할을 했다. 의학(醫學)은 인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의관을 제수할 때는 반드시 재주를 상고하고 자격에 구애받지 말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의관들은 임금의 측근에서 어약(御藥)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자(加資)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천문(天文)의 변화와 관측을 중요시했으며 천문에 정통한 음양관을 발탁하여 음양학을 적극 권장했다. 율관은 실제 법률(法律)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직무였다. 율관의 판단에 따라 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잡과중인들은 양반층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신분상의 한계점은 조선말에 이르러 그들로 하여금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또 근대화 과정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들의 실체는 조선 사회의 신분 구조, 나아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친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잡과에 입격한 사람들의 명부가 바로 『잡과방목(雜科榜目)』이다. 방목 간행은 누가 과거시험에 합격했는지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과거시험의 공정성을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방목을 작성할 때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녹명단자(錄名單子)를 대조하도록 했다. 『잡과방목』에는 단순히 입격자 본인의 성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격자의 신분과 가족 상황 등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다른 과거의 방목에서는 손쉽게 접할 수 없는 부친·조부·증조·외조·처부·형제 등 가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 시기적으로 15세기 말(1498년)부터 19세기 말(1894년) 과거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400년에 걸친 광범한 자료가 남아 있다. 특히 우리가 중인 연구에 있어 잡과방목을 주목하는 것은 실록 등의 연대기에는 잡과의 운영과 잡과입격자에 관한 자료의 편린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무과나 생원진사시는 실시 시기, 시험관, 장원 급제자의 성명, 선발 인원, 방방, 은영연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으나, 잡과 실시에 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전의 경우도 잡과에 관한 규정은 소략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잡과방목은 조선시대 기술관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본 『잡과방목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조선시대 잡과합격자 총람』(이하 『총람』으로 줄임)을 저본으로 하고, 필자가 그 동안 자료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잡과단회방목』 4종을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 하였다.4) 특히 『총람』의 출간 과정에서 지면 관계상 누락된 입격자 본인 및 부친·조부·증조·처부·외조부 등 가계 구성원의 모든 관직과 품계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본 잡과방목 데이터베이스 간행을 통해 잡과제도사, 잡과합격자, 그리고 그들의 가계 배경 및 사회적 지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잡과중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이회, 1999, 1쪽) 참조.
2)『정조실록』권3, 정조 원년 3월 임오. 잡학은 국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었다. 3) 이남희, <조선시대 잡과방목의 자료적 성격>(『고문서연구』12, 1997). 4)추가된 방목은 『庚子式年文武科榜目』(중종 35년(1540) 식년시), 『癸卯式年榜目』(중종 38년(1543) 식년시), 『甲子式年文武科榜目』(명종 19년(1564) 식년시), 『隆慶庚午文武榜目』(선조 3년(1570) 식년시)에 수록되어 있는 「잡과단회방목」이다. 기존의 「잡과단과방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16세기 잡과중인의 신분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의 잡과 실시는 태조 6년(1397)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후 정종 1년(1399)에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로 정비되었다. 그 이후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으로 인해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500년간 실시되었으며, 그 회수는 총 233회로 파악된다. 현재 조선시대 전체 잡과합격자의 명단을 수록한 방목은 전하고 있지 않다. 『잡과방목』은 편찬시기와 수록 과목에 따라 「단회방목(單回榜目)」과 「단과방목(單科榜目)」으로 나눌 수 있다. 「단회방목」은 어느 한 시험이 끝난 후 그 시험의 합격자만을 수록해서 간행한 방목이며, 「단과방목」은 한 과목의 합격자 명단을 전 시기에 걸쳐 종합해서 수록한 방목이다. 즉 단회방목은 한 회분의 방목이며, 단과방목은 『역과방목』, 『의과방목』, 『음양과방목』, 『율과방목』 등의 집성된 방목을 말한다. 현전하는 잡과방목은 단회방목과 단과방목을 합해서 모두 177회분에 이른다. 이는 전체 233회 잡과 실시 중 76.4%에 해당한다. 방목별로는 단회방목이 14회, 단과방목이 170회분이다. 현존하는 단회방목과 단과방목의 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단회방목은 각 회별로 합격자가 수록되어 있고, 단과방목과는 달리 집성되어 있지 않아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표지가 낙장 되어 단회방목의 책명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잡과방목의 대부분은 단과방목으로 『역과방목』·『의과방목』·『음양과방목』·『율과방목』 등과 같이 과목별로 구성되어 있다. 단과방목의 내용은 대략 1630년대 이후 합격자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잡과방목을 단회방목과 단과방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잡과방목』의 각 과별 수록 연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15세기 말(1498)부터 19세기 말(1894) 과거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400년에 걸친 광범한 기록을 접할 수 있다. 역 과: 연산군 4년 ~ 고종 28년 (1498~1891) 이들 잡과방목의 간행이 19세기에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19세기에 이러한 잡과방목류가 성책(成冊)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는 중인층의 신분 의식의 강화 및 신분 상승 운동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세기 말 전개된 중인통청운동을 주도하는 관상감, 사역원, 전의감, 혜민서, 율학 등의 유사(有司)들은 거의 합격자들임을 잡과방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잡과방목의 작성 역시 잡과합격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잡과방목』의 내용을 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합격자 성명, 본관, 거주지, 전력, 경력 등의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다. 즉 본인의 경우 성명이 기재되며, 초명, 개명, 일명이 있을 경우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자와 생년이 기재되어 있어, 시험 연도를 통해 잡과 합격시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문무과와는 달리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과거에 합격했다. 그리고 본관과 거주지가 있어 신분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관직과 품계를 통해서는 합격자들의 관로(官路)를 추적할 수 있다. 규정상 제약을 가지고 있던 합격자들의 진출 상황이 어떠했는지, 즉 정3품 당하관이 한품(限品)이었던 역관, 의관, 음양관, 그리고 종6품에서 거관(去官)했던 율관이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친인척의 경력, 과거 합격 등에 관한 정보도 다루어져 있다. 합격자의 4조(부친, 조부, 증조부, 외조부)와 처부, 형제, 친척 등이 기재되어 있다. 양자로 출계(出系)한 경우에는 생부도 기재되어 있다. 이들 가계에 관한 기록은 잡과 합격, 기술 관청의 근무 여부 등 기술직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기재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들 가계 구성원에 관해서는 먼저 성명, 다른 혈연인 외조와 처부의 성관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다. 외조와 처부의 성관을 통해 잡과 가문의 혼인 양상을 알 수 있다. 역시 잡과합격자 가계의 관직과 품계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합격자 부친·조부·증조 및 처부와 외조 등 가계의 지위는 그들의 출신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부친·조부·증조를 통해서는 합격자 직계의 가계 배경을 알 수 있고, 처부를 통해서는 합격자 혼인 가계의 지위를, 외조를 통해서는 부친 혼인 가계, 모계(母系)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잡과방목』은 연대기, 법전 등의 자료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잡과 운영의 실태와 잡과합격자들의 신분과 배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 잡과시험은 역관·의관·음양관·율관 등 기술관들의 주요한 입사로(入仕路)였다. 참상관(6품이상) 이상의 고급 기술 관료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잡과 합격이 필수적인 관건이었다. 잡과는 문·무과와는 달리 전시가 없이 초시와 복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험 종류에 있어서도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와 증광시(대증광시)가 있을 뿐이었다. 문과나 무과의 경우 양반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광시 외에도 다양한 별시가 실시되었지만(예컨대 謁聖試, 庭試, 春塘臺試, 重試, 春試, 拔英試, 登俊試, 進賢試, 擢英試, 求賢試, 賢良試, 忠良試, 新舊試, 丕闡試, 道科, 明倫堂試, 節日製, 黃柑製, 通讀, 殿講, 到記科 등이 그것이다), 잡과의 경우 식년시와 증광시만이 실시되었다. 잡과의 합격자 숫자는 총 46명으로 역과에서 19명(한학 13명, 몽학·왜학·여진학 각 2명), 의과·음양과(천문학 5명, 지리학·명과학 각 2명)·율과에서 각 9명을 시취했다. 선발 인원은 식년시와 증광시가 동일했다.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를 수여한 뒤 등위에 따라 7품에서 9품까지의 관품을 주었다. 1등은 해당 아문에 서용하고 2, 3등은 해당 아문의 권지(權知: 임시직)에 임명했다.
법전의 규정이 실제 잡과 인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실제로 잡과 식년시와 증광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을 선발했을까. 그리고 선발 인원의 규모는 일정했는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는가. 이는 구체적으로 잡과에 선발된 인원수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잡과의 실제 실시와 그 운영 실태는 잡과방목을 토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잡과방목은 연산군 4년(1498)의 그것으로, 그 이전 방목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방목을 토대로 검토하면, 연산군 4년(1498)부터 고종 31년(1894)에 이르기까지 총 177회의 잡과 실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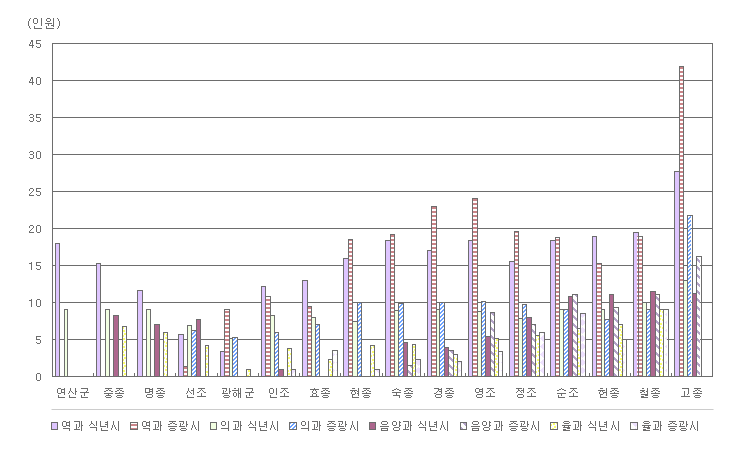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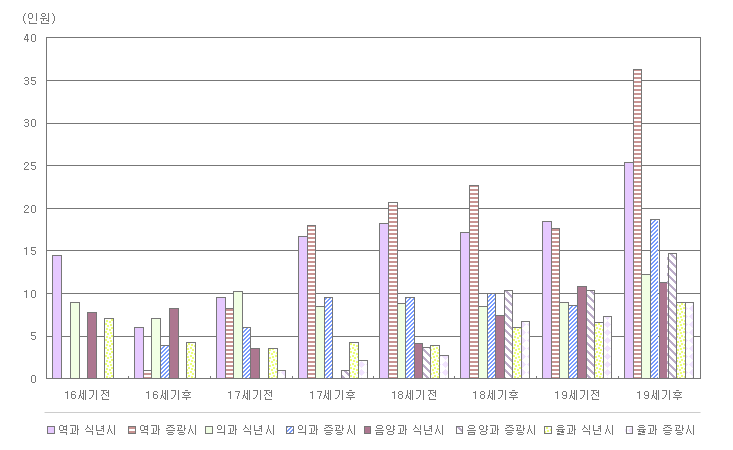 선발 인원을 보면, 법 규정대로 46명(역과 19명, 의과·음양과·율과 각 9명)을 선발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19세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잡학(雜學)의 특성상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능이 우수한 자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평균 선발 인원이 57.9명으로 급격하게 증가, 법정 인원 48명보다 약 10명씩 더 뽑았다.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은 잡과 운영 체제의 이완에 기인한다. 잡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측면이 약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전반기까지 법정 인원대로 선발했다는 것,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다른 과거제의 남설(濫設)과 비교해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잡과는 다른 과거제가 문란 되는 것과는 달리 규정에 의거해 합격자를 선발했으며, 증광시(35.9%) 보다는 식년시(64.1%)를 근간으로 운영되었다. 잡과에서도 18세기 말부터 왕실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부(直赴)가 이루어졌다. 이는 종래 잡과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다. 직부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조 14년(1790) 시험으로, 이후 최소한 25%의 직부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잡과 운영에서 추부(追付)가 실시되었다. 점수는 같으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나중에 다시 합격시켜 준 것으로, 19세기 잡과합격자의 급증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5)참고로 본 「잡과방목 데이터베이스」에는 잡과가 실시된 역관, 의관, 음양관, 율관 이외에 취재(取才)만이 시행되었던 산원(算員)도 함께 수록하였다. 산원은 산학(算學), 즉 국가의 회계업무에 종사한 하급 기술관으로 합격자 명부인 『주학입격안(籌學入格案)』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학입격안』은 홍치(弘治) 연간 즉, 연산군 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정확한 연도 표시 없이 홍치(弘治), 정덕(正德), 가정(嘉靖)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선조 1년(1568)부터 연도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 연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총 1,627명 중에서 합격년도 미상자 559명을 제외하면 141회에 1,09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 확인된다(최진옥, <조선시대 잡과 설행과 입격자 분석>(『조선시대 잡과합격자 총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이러한 연도 미상자에 대해 합격 추정 연도를 밝힌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김두헌,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그러나 본 『잡과방목 데이터베이스』에는 잡과방목 원본에 미상자인 경우 그대로 밝혀두어, 원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6)이남희, 앞의 책(1999), 51~61쪽.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기술관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으나, 역대 왕들은 기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다. 3품 거관(去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신들의 견제와 차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위 품계와 관직을 제수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잡과 합격 후 품계에 있어서는 98.9%가 당상관으로 승급했으며, 관직에 있어서는 71.0%가 참상관 이상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2품의 반열에 올랐다 해도 조정에서는 잡류(雜類)로 대우하여 재추(宰樞)의 반열에 넣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불안했다. 사소한 사건이나 혹은 의료 행위의 잘못 등으로 치죄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은 중시하지만 신분에 대해서는 차대하는 경향이 일관되고 있었다. 이처럼 고위 관품의 제수도 쉽게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무 고과를 철저히 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에서는 합격 이후에도 각종 취재(取才)와 거관(去官), 구임(久任), 표폄(褒貶) 등을 통해서 기술학의 정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기술학에 대한 장려와 함께 그들에 대한 통제책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술관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던 양반사회에서는 기술학 전공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독특한 계층을 형성했다. 또한 일정한 사회적인 차대는 그들의 결속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동류의식, 그들 사이의 통혼을 통한 신분적 유대의 강화,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세전성(世傳性) 등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신분의 동요와 해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그들의 경우 세전과 통혼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이동이 정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실무적인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들의 직분을 활용해서 각종 상업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혹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관의 경우, 밀무역 등을 통해 역관 자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역관들의 최고의 목표는 부경 수행이었다. 그들의 무역 활동이 조선 중, 후기 무역의 중심을 이루었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들은 독점 상업 활동과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 세력과 결탁하여 유통 경로를 장악하기도 했다. 사행에는 역관뿐 아니라, 의관, 음양관 등도 참여했다. 의관들은 약재무역업, 의료 행위를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19세기가 되면 많은 의관들이 약방(藥房)을 개설했다. 음양관은 풍수지리, 율관은 법률 전문 지식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문 지식을 밑천으로 생활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문물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조선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도자 역할을 했다. 청나라에 수행한 역관들은 각종 시설을 견학하고 북경 유리창 서점을 둘러보았으며, 과학·윤리·지리·종교 등에 관한 한역 서양학술서적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리고 의관·천문관 등 담당 기술관이 직접 사행에 참여하여 서적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학문적 감흥과 함께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북학(北學)과 서학(西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경제적인 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을 가졌으며, 그것에 바탕을 둔 문화 활동을 전개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위항문학(委巷文學)이나 19세기에 들어서 「팔세보(八世譜)」 등의 중인 족보를 편찬한 것, 그리고 중인 통청(通淸) 운동을 전개한 것 등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위항지사에서 경론가로서의 꿈을 키우기도 하고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의 독자적인 계층으로 형성되었다. 요컨대 『잡과방목』은 잡과합격자 나아가서는 중인의 사회적 배경과 지위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일차 자료라고 하겠다. 지난 2002년 『CD-ROM 잡과방목』이 간행된 바 있으며, 이제 다시『잡과방목 웹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잡과방목 DB를 자유롭게 검색, 열람,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조선시대 잡과, 잡과방목, 중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조선시대 사회상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