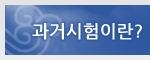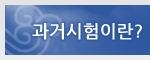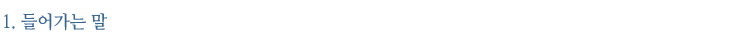
조선시대의 관료는 문·무과 출신의 문·무관과 문음(門蔭) 등을 거쳐 출사(出仕)한 음관(蔭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출사로는 문·무·음 세 길이 있었다. 이 세 출신 관료들은 관료조직의 구성원이었으며, 당시 권력구조의 틀 속에서
정치를 운영해온 지배세력이었다.
음관은 문음·천거·특지 등 과거제 이외의 모든 관료임용제도에 의해 임용된 관료이었다. 음관을 선발하는 인사제도는 문음과 천거(薦擧)로
대별되며, 이를 합쳐 음서제(蔭敍制)라 한다. 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어왔던 문음은 부조(父祖)의 공음(功蔭)에 따라 관리를
서용하는 인사제도였다. 문음취재(門蔭取才) 출신자들에게 초입사(初入仕)를 허용하여 임기가 차면 실직(實職)에 서용하였던 것이다.
천거 출신 입사자도 또한 음관이었다. 조선 중기에 신흠(申欽)이 문·무·음 세 출사로 중 음직에는 보거취재(保擧取才)와 공천이선(公薦里選)이
있다고 한 바와 같다. 천거는 유일(遺逸) 이외에도 천거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효행자, 성균관공천, 향천(도천), 적장천 등이
시기에 따라 중요도 및 비중의 차이를 나타내고, 대우와 범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귀족제적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음서제의 이러한 귀족제적 특성은 과거제와 비교하여 조선시대의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음(蔭)’은 사전적 의미로는 ‘부조(父祖)의 유훈(遺勳) 또는 문벌(門閥)의 여영(餘榮)에 의하여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다.
그 특별대우란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문음취재와 종친음(宗親蔭)·공음을 통한 실직등용, 대가(代加), 특수시위군(特殊侍衛軍)에의
입속, 천거에 의한 출사, 적장천(嫡長薦)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 품계를 받는다든가 체아직(遞兒職)을 받는 경우에는 음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실직으로 초입사하기 이전에 음을 통해 품계가 더해진다거나 동정직·체아직을 받았다고 해서 음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관 초입사라 함은 음에 의해 직사가 있는 동반직에 임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음서출신의 음관은 문무의 과거
출신과 출신상의 구별이 있었다.
이러한 음관은 선초부터 문과합격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음관의 초수관품과 초직으로서 권지직을 받는다는 사실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성중관 입속과 권무직·권지직 등의 입사가 주로 이루어지던 음관은 세조년간에 이르러 초입사직이 참봉중심제로 개편되면서
음관 초입사직의 정직화가 단행되었다. 따라서 음관의 지위는 조선 건국 이래로 꾸준히 현실화되었지만, 음관의 청요직 진출 제한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료적 성격을 갖는 음관은 시기에 따라 지위상의 변화를 겪었다. 성종년간에 대두하기 시작한 사림들은 기존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단행하였다.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림들은 구질서의 개혁을 도모하는 가운데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과 병존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무관과 대항하는 음관은 점차 정치구조의 핵심적 지위에서 배제된 채 구조화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림의 벌열화와 각 정치세력의 갈등 속에서 음관의 정치적 역할은 중시되었으며, 음직과 음관수의 확대로 문벌을
더욱 중시하는 관료제사회로 변화되어 나갔다.

음관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의 입사경로를 통해 음관의 실체를 밝혀보자. 조선시대에는 관료들의 출신을 입사경로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였다. 태종 14년(1414) 정월의 기사를 보면, '제수계본(除授啓本)과 이문(移文)이 대내(大內)에서 나와 제수하는
자는 특지(特旨)라 칭하고, 단자(單子)로 계문하여 제수하는 자는 모인천(某人薦)이라 칭하며, 공신 및 2품 이상의 아들과
사위는 모자서(某子壻)라 칭하고, 전함관안(前銜官案)에 붙인 자는 전함관안이라 칭한다.'고 하여, 조선 초기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문무과 출신자 이외의 관료들의 출신을 밝혀놓는다는 사실이다. 임금의 특별명령이라든가 천거, 문음,
전함관안 등재 등 네 가지 임용제도에 의해 등용된 관료들의 출신내력과 동태는 정안(政案)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정안은 문음무 관료들의 명단이면서, 그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었다. 관료들은 초입사 당시의 출신만 다를 뿐, 문·무 관직구조의
어느 한 반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렇지만 다기한 출신성분을 가진 관료들은 이후의 인사에 있어서 관직과 출사로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됨과 동시에 출신에 따른 배타적 관료구조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문무과 외의 여러 출신들은 하나의 관료군으로서
문무반과 대등하면서 차별적인 반열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음관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자. 실록에서는 세종 23년(1441)의 동지중추원사
유은지(柳殷之)의 졸기(卒記)에서, '음관으로 보하여 여러 번 이조와 병조 정랑으로 옮겼다.'고 한 데서 음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보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후 오랫동안 보이지 않다가 명종대에 와서 다시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자주 거론되어 점차
하나의 관료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음관의 용례가 조선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음서제도가 시행되는 한 그 용어는 얼마든지 쓰일만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고려사』에서도 이미 그 용례가 보이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고려사』 음서조에 실려있는 음관의 용례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문무 5품 이상의 직자(直子) 한 명에게 음관을 허락한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재추 및 문무 3품으로 致仕하여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직자 한 명에게 음관을 허락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둘째의 규정과 아울러서 4품 및 급사중승과 제조의 낭중,
중랑장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자는 시섭직을 논하지 말고 아들 한 명에게 음관을 준다고 하는 규정이다.
조선조에 들어선 후 명종 이전의 음관의 용례는 앞서의 세종조 기사 외에 인물지에 보이고 있다. 한계미(1421-1471)와
박치(1439-1497)의 사례가 그것이다. 한계미는 '음관으로 정난공신에 참록되어 이조판서에 제배되었다' 하고, 박치는 묘표에서,
'처음에 음관으로 사진했다'고 하였다.
음관의 용례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명종대에 들어선 후부터이다. 명종 6년(1551), 대왕대비와 왕이 대신들을 인견한
자리에서, '문관과 무관 그리고 남행(南行)' 혹은 '대간과 시종, 음관'이 언급되었다. 또한 명종 6년 12월의 마전·적성·우봉
등지의 도둑 횡행에 대해 '시임 수령들은 모두 음관이라서 속수무책'이라 하여, 수령 가운데 음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왕
8년에 유학 서엄이 상소한 내용 가운데 다섯 번째의 탐오한 용관을 없애자는 조목에서는, '대저 대간·시종에 있는 사람이거나
재상·문사의 무리가 탐오하고 방종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무인·음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라고 하고, 벌열과 문지의 귀천에
따라 선발되는 음관은 자격지심으로 탐욕이나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히 문음으로 선발되어 관료가 된 자를
음관이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음관의 정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는 1583년(선조 16), 성주(星州)에 사는 생원 하항(河沆)이 올린 상소이다.
"신은 듣건대, 천거로 벼슬하는 자를 전하께서 음관이라고 지목했다 하는데, 음이라는 것은 그 선세(先世)의 훈공을
이어받고 그 가문의 공덕을 배경으로 벼슬하는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 이미 음관으로 배척하셨으니, 아랫사람들이 곁눈질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한 문제야말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한데, 이이는 일찍이 변론한 적이 없으며 청대할 때마다
장황하게 절실하지 않은 말만 하였으니, 이는 그의 학문이 올바르지 못하여 경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하항은 음관을 '선세의 훈공을 이어받고 가문의 공덕을 배경으로 벼슬하는 자'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선조가 천거로 벼슬하는 자를 음관으로 배척한데 대해 비판하면서, 이를 변론하지 않은 이이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관은
"우리 나라의 벼슬길에는 문·무·음의 세 가지가 있으며 천거를 통해 벼슬하는 자를 미출신인(未出身人)이라 한다.
상(선조를 가리킴-필자)이 미출신인까지 합쳐 일반적으로 음관이라고 일컬은 적은 있지만, 이이 등은 함께 포함시켜 일컬은
적이 없었다. 하항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자로서 은근히 추천을 받아 관계에 진출하게 되기를 기대했으므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음 자의 뜻을 극력 변론하는 한편, 이이가 이를 변론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여겼다."
고 평하고 있다. 위 사관의 언급에 따르면, 조선의 벼슬길은 문무가 아닌 문·무·음의 세 갈래길이 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음사(蔭仕)의 관료는 음관이었다. 그런데 천거 출신은 미출신인으로서, 하항은 이들을 음관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선조에게 행검지사(行儉之士)인
이들을 음관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이들을 중용하여 태평의 치세를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선조와는 달리 미출신인을 음관이라 칭한 적이 없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천거 출신 곧 유일(遺逸)을 음관과 구별해
보고자 한 데 있었다. 하항도 역시 음관은 음출신이라 정의하고 미출신인은 음관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이와는
같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선조가 미출신인을 음관이라 여겨 배척한 일을 이이가 모른 채 변론하지 않자, 하항이 이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사림들의 음관에 대한 차별의식은 관료를 문·무·음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관례화 되어 갔다. 관료 구성상 음관의 관료군으로서의
지위가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정치적 환경변화로 노골화 된 것이다. 따라서 하항과 선조의 음관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는
사림정치의 전개와 관계가 깊다. 하항의 입장은 학문적 연원과 정치적 성장배경을 함께 하는 유일을 음관과 동류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림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선조 6년에 김우옹이 미출신자인 유일의 대관 임명에 대해,
"또 이들은 행실과 도의가 있는 사람들로서 문음취재에 견줄 것이 아님은 물론 급제한 선비보다도 나으니, 위에서는
남항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산림의 선비는 본디 자급이 없으니, 그 재품에 따라 차서에 구애 없이
쓰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 유일 피천자는 문음이나 과거출신자보다 행실과 도의가 뛰어나며, 임금은 이들을 남항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선조는 지나치다고 여기고 따르지 않았으니, 그는 유일도 남항, 즉 음직인과 동류로 인식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봉령이 나서서 '산림의 조행이 있는 선비를 혹 6품에 서용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거나 각사에 임용하여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특이한 자가 있거든 차서(次序)에 구애 없이 발탁해서 쓰소서.'라 청하니, 선조는 이를 옳다고 여겼다.
즉 선조는 유일을 음직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들을 발탁해서 등용하는 일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위 하항의 상소는 곧 음관과 유일을 차별화 하려는 사림들의 이해의 표현이었다. 유일은 조선 건국 직후 도평의사사에서
건의하여 채택된 천거제도에서 밝힌 천거의 종류 가운데 '경학에 밝고 행실을 수양하며 도덕을 겸비하여 가히 사범이 될 만한
자'를 가리켰다. 그런데 사림정치가 시작된 이후 사림들은 성종년간부터 스스로 저질의 관료로 천시해 온 음관을 자신들의 분신인
유일과 동렬에 위치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의 기사는 천거 출신이면 누구나 곧 음직자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신흠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사람을 취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과와 무과, 음직이다. (중략)
음직은 보거취재(保擧取才)하고 공천이선(公薦里選)한 후에 주의(注擬)를 허락하니, 대개 2백년은 바뀌지 않았다."
위 기사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신흠이 취인지로(取人之路)를 설명한 내용이다. 1586년(선조 19) 문과에 합격한 신흠은
인조 5년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로서, 위 인용문을 언급한 시기는 인조년간인 것 같다. 여기에서 음직은 일종의 과목(科目)처럼
쓰이고 있으나, 보통 음직의 용례는 음사자(蔭仕者)에게 제수되는 관직을 뜻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흠이 말하는 문무과 외의
음직은 보거취재인 문음과 공천이선인 천거제도를 가리켰다. 따라서 일종의 과목인 음직이 문음 외에 천거도 포함하는 출사로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삼과(三科)에 의한 취인(取人)의 역사가 2백년이 되었다고 한 말이 주목된다. 곧 조선 건국 이래로
문과와 무과, 음직 이 세 갈래의 입사로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지와 전함관안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료로 출신하는 한 방법이었다. 먼저 전함관안은 관안에 등재된 전직자를 가리켰다. 이들은
이미 초입사 때 출신이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문·무·음관 중 어느 한 출신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물론 초입사 이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면 그는 음관에서 문관으로 출신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전함관안은 음관 뿐 아니라 문무관의 전직자를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지는 국왕의 특별명령이라는 의미로서,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의 특지는 국왕의 자천에 의한 특별임용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국왕에 의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특별명령을 특지라 하고, 또 『속전등록』 내의 반부내력조(班簿來歷條)에, '문무관의 3품
이하를 임금이 친히 제수하는 것을 특지라고 한다.'고 하였다. 특지에 의해 초입사하는 음관에게 적용된 시재(試才) 후 임용원칙은
문음 출신자와 같은 예에 따른 것이다. 특지에 의한 인사방식은 국왕의 음덕에 의한 것으로 음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제3자의 음덕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거가 그러하거니와, 왕에 의한 천거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지에 의해 임용된 초입사자도 음관으로 보는 것이 당연함은 이러한 이유라 하겠다.
음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경로 가운데 보다 광범하게 시행된 제도는 천거제도였다. 천거는 대체로 두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하나는 인재등용이요, 다른 하나는 정부의 교화정책에 부응하는 모범자에 대한 국가의 포상이었다. 이들에게 제수되는 관직은
능직(陵直)이나 녹사(錄事), 부직장(副直長), 참봉(參奉), 부승(副丞), 주부(主簿), 지평(持平) 등 대간직, 육조낭관,
수령직 등이었다. 능직이나 녹사는 문음취재 입사자들이 초입사하던 권무직(權務職)이며, 주부·대간직·수령 등은 성종년간 이래의
음관의 차별대우와 유일의 우대조치에 따라 유일들에게 제수되는 관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유일이 음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관만이 임명되는 청요직에 유일의 진출은 역시 제한적이었으며, 산림들이 스스로
음관이라 자처하는 데서도 음관으로서의 유일은 관료적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위의 명종년간의 기사에서 '문관과 무관, 남항'을 언급한 바 있는데, 남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남항은 권지(權知)를
뜻한다. 문과합격자를 권지로 삼관에 분관하였을 때의 삼관권지를 '삼관남항(三館南行)'이라 한다든가 그외에 '사관남항(四館南行)',
'훈련원남항(訓鍊院南行)', '훈련원과 군기시, 사복시 남항에 분속시켜 삼관(三館)을 만드니 문신의 예와 같다.'는 등
권지를 남항이라 대신 쓰는 여러 사례에서, 남항과 권지가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각사남항이나 삼관남항 등은 곧 각사권지,
삼관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중종년간에 보이는 것들로서, 이때에는 이미 각사의 권지직이 혁파된 뒤이다. 따라서 문무과 합격자의 권지분속에서의
권지는 각사의 권지직 혁파 이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남항과 서로 혼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각사의 남항은 권지직 혁파 이후에
그 의미가 점차 변하여 권지직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권지직에 초입사했던 문음출신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즉 남항이 권지직의 혁파로 점차 음직인의 별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명종 원년과 8년의 기사에서 남항은 음직인을 가리킨다는 세주를 달아놓은 것은 그 결과였다. 음직으로 진출한 자들을 남항이라
칭하였음은 이로써 명확해졌다. 홍문관이라든가 육조낭관 등 주로 문과출신자들이 차지하는 소위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남항도
역시 음관출신자들이었으며, 의금부낭청도 음직이었다. 따라서 남항으로 문반에 진출한 자는 음관이었다. 그러나 남항 중에는 무반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남항선전관이니 남항부장이니 하는 식으로 관직명에 남항을 겸칭하여 음출신임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음관으로 칭하지는 않았다.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문음출신자와 남항, 천거를 통한 입사자들은 모두 음관이라 지칭되고 있었음을 알았다. 명종년간부터 음관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선조년간에 이르러서는 전 관료를 문·무·음으로 그 출신에 따라 구별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문무과 출신의 문무관 이외에, 기타의 문음과 천거제도 등 다기한 입사경로를 통하여 진출한 관직자들이 음관이라는 하나의 관료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 양반지배신분층 연구에서 논의된 제특권 가운데 과거와 문음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귀족적 속성을 직접
반영하는 문음제도는 조선시대 양반관료제의 개방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양반신분의 지위를 유지하는 특권으로만 이해할 뿐, 그
규모나 기능을 축소해 버린 느낌이다. 그런데 본 절에서 문음제와 음서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음관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음서라는 관료임용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보다 음서제가 관료 등용의 주요 통로 구실을 하였으며, 신분제사회에서 양반지배층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제도적으로 운영한 기본적인 사회통제장치가 음서제였다고 생각한다. 제도로써 고려시대부터 수백 년을 시행해 온 음서제가
어찌 특권의 하나로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음서제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 음서를 관계규정에 보이는 문음(門蔭)과 공음(功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음서제가 문음제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견해가 그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蔭)의 개념과 음관의 존재에 따른 음관선발제도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음서라는 개념은 문음과 공음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음서는 문음과는 상이한 용어이다. 음서는 '문음서용(門蔭敍用)'의 준말인
동사형 어구인 듯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문무 과거출신의 문무관에 대항하여 다양한 인재선발방법으로 임용된 음관의 존재를 인정하다면,
문무 과거 이외의 모든 관료선발방법은 과거제와 대비되는 음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음서제와 음관의 관계를 알아보자. 조선시대에 과거제 이외의 임용제도를 통한 출사로는 대체로 문음취재와 종친음·공음,
대가, 특수시위군 입속, 천거 등이 있었다. 천거를 포함하여 모두 음서와 관련 있다. “의산위 남휘의 경우 그의 얼서 이귀동은
그의 음으로써, 첩의 아들 여는 그의 형 지의 음으로써 모두 직을 받았다.”고 한 백관가자(百官加資)와 관련된 대가의 사례에서,
대가에 의한 수직은 음으로 인식되었다.
충순위 입속도 유음자제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전으로 파악된다. 이 특수군 제도는 능력이 없어 음자제 취재에조차 합격하지 못한
음자제들이 원한다면 공신적장·충의위·충찬위·충순위 등 특수군에 입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신 및 양반관료의 자제들로
특수군을 편성함으로써 그들의 입사로를 열어줄 뿐 아니라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한계순의 경우에,
『국조인물고』에서는 '처음에 문음으로 충의위에 보임되었다가 세자우세마를 지냈다.'고 한 것이 그 한 사례이다.
음관은 음서출신으로 직사가 있는 동반직에 등용된 자를 가리켰다. 이때의 직사가 있는 동반직은 무록관(無祿官), 권무·권지직,
성중관, 겸관직(兼官職) 등을 포함한다. 음관으로 초입사하기 이전에 음을 통해 가자(加資)되었다고 해서 음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충순위의 입속도 음관으로의 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체아직도 음관의 초입사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을 줄로 믿는다.
체아직은 비양반관리들을 참하관에 묶어 두고 적은 관직으로서 많은 관직후보자를 교대근무시킴으로써 국가의 녹봉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었다. 승·부승, 주부, 직장, 령은 육조 속아문에 속한 종5품, 종6품, 종7품의 녹관으로서 성중관의 동반체아직이었다.
동반체아는 본래 15원 밖에 되지 않았다. 최무선의 아들 해산을 군기주부로 삼았다거나, 유일로 천거된 고약해를 공안부주부에
제수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들 관직이 음출신의 초입사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반체아직은 세종 22년에 모두 혁파되고 서반체아에
차하하도록 하기 이전까지는 음관 초입사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반체아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아직은 정직이 아닌 여러 무록관이나 군사들이 수직한 것으로서, 이들에게는 체아록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체아를 수직한 사람들은
이미 무록의 실직이나 권지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아직이 곧 음관의 초입사직이 될 수 없다. 또한 양반자제 중 미관자(未官者)의
예비체아(豫備遞兒)로서도 널리 활용되었으므로 입사 이전의 체아수직자를 음관이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직관료가 체직 혹은
거관하였을 때 체아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음관으로 체직되어 체아를 수직하였을 경우에 음관이 아닌 무관으로 그의
출신이 바뀔 수 없었다. 그는 그 이후의 이력에 반드시 음관 출신으로서의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미의 경우에도
18세인 세종 20년에 공신 사손으로서 충의위에 입속하였다가 같은 해에 사용에 제수되었다. 이 사용이 서반체아직이라 하더라도
그를 무관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별좌와 별제는 음출신자의 초입사직이었다. '공신자제의 의순고별좌(義順庫別坐)'라든가 '내수(內?)의 상림원별좌' 입속 등의
기사에서, 별좌는 공신자제와 내수, 성중관 등에게 제수되었다. 별좌는 무록의 체아직으로서 3품 이하 6품 이상의 참상 권지직이었다.
세조 12년의 관제개편으로 권지직이 혁파되었으나, 별좌는 그대로 존속하였다. 그런데 성종조의 기록에서 별제, 별검 등의 새로운
관명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별제 등은 별좌가 참상직인데 반하여 참하직으로 설치된 것인데, 아마도 참하 권지직의 혁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초의 음관 초입사직은 권무·권지직 뿐 아니라 성중관, 무록관 등이 있었다. 이들 관직들은 직사가 있는 넒은 의미의
동반직이었으므로 산직자나 체아직 등은 음관 초입사직이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세조년간의 관제개편으로 권무·권지직이 혁파되고,
참봉·봉사 등으로 정직화가 단행됨으로써 음출신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별좌류 등의 무록관은 참하직의
신설 등으로 확대 존속되었다.
그러면 문음출신자에게 원하면 허락한다는 동정직은 음관 초입사직으로 볼 수 있는가. 잘 알다시피 동정직은 직사가 없는 영직(影職)
혹은 허직(虛職)이다. 그러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는데, 사실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동정직
제수와 성중관 입속허용, 세조년간의 관제개편 등이 문음제의 약화 혹은 비중의 감소 등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문음제의 새로운 제도로의 보완은 오히려 음관 초입사직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범위를 확대시켜준 것이다. 또한 세조년간에 권무·권지직이
참봉 등으로 직제개편이 단행된 것은 음관의 초입사직이던 임시직을 정직으로 만들어준 획기적인 조치였다. 음관의 초입사직이 참봉중심제로
개혁됨으로써, 음출신의 현실적 처우개선이 보다 안정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조선초음직(蔭職)은 음출신 초입사자와 그들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제수되는 관직을 말한다. 문관과 무관에 대항해서 존재하는 음관의
독점적 관직이 아니라, 음출신에게 허용된 관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초에 문음제도를 실시하면서 승음자(承蔭者)들에게
주는 초직에 대해서는 품계만을 명시하였을 뿐 초직의 종류 등은 논의되지 않은채 권무·권지직, 성중관, 동정직, 별좌류 등에
제수되었다. 음관이 초입사한 이후에 승진·천전(遷轉)할 경우에는 지방관직과 육조 속아문에 속한 관직에 제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초에 진신자제들이었던 음직자들의 승진과 천전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려는 논의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문음제도는 문과합격자와
동등한 대우로써 초입사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문음출신자에게 제수되는 관품은 문과례(文科例)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다. 즉 태종
13년 7월의 사간원의 상소내용에서, 18세 된 문음자제는 예문관에서 실시하는 취재시험에 일경(一經)만 통해도 문과례(文科例)에
따라 패(牌)를 지급하고 벼슬살이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를 『경제육전(經濟六典)』의 규정을 통해 문과합격자의
초수관품(初授官品)과 비교해 보면, 문음출신자에 대한 대우는 문과합격자와 동등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승음자와 문과합격자의 초수관품직 비교
| 父祖의 관품 |
長子의 관품 |
|
문과급제자 초수관품직 |
| |
|
장원 |
종6품(직) |
| 정1품 |
정7품 |
갑과 |
정7품(직) |
| 종1품 |
종7품 |
| 정2품 |
정8품 |
을과 |
정8품(직) |
| 종2품 |
종8품 |
| 정3품 |
정9품 |
병과 |
정9품계 |
| 종3품 |
종9품 |
이 표를 통해서 보면, 문과합격자의 장원은 특별히 우대되어 종6품을 받았다. 그러나 문과 갑·을·병과 합격자의 초수관품은 승음자와
동등하였다. 문음출신자는 부조(父祖)의 관품 1품부터 3품까지의 순서에 따라 정·종 7·8·9품을 받았는데, 문과합격자의 갑·을·병과의
초수관품도 정품만으로 7·8·9품을 받았던 것이다.
초수관품 뿐 아니라 문과 을·병과 합격자의 권지(權知) 분관(分館) 역시 문음출신자의 권지입사와 같다는 사실은 문음출신자와
문과합격자의 동등한 대우를 재확인시켜 준다. 권지로서 분관한 급제자들은 특별한 재능이 없거나 문벌의 배경이 없는 한 진출이
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0여 년 동안 공부해서 문과에 급제하여 삼관에 분관되면 권지로서 6-7년을 지내야 비로소 9품을
받고, 그러고도 4-8년을 더 근무해야 6품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니, 30-40세에 급제한 사람은 삼관에서 늙어버리기 쉬운
것이 문과합격자의 처지였다. 그리하여 삼관의 권지가 적체되는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음출신들은 오히려 문과합격자에 비해 출세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
<표 2> 조선 초기 음관의 문과급제 현황
| 왕대 전력 |
태조 |
정종 |
태종 |
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 |
예종 |
성종 |
계 |
유학·생원
·진사 |
63 95.5% |
29 87.9% |
226 85.3% |
325 69.3% |
39 53.4% |
58 54.7% |
157 50.8% |
14 42.4% |
260 58.4% |
1,171 65.1% |
| 원유 계자 |
음관
|
2 3.0% |
1 3.0% |
33 12.4% |
119 25.4% |
22 30.1% |
26 24.5% |
84 27.2% |
13 39.4% |
76 17.1% |
376 20.9% |
|
무관
|
1 1.5% |
1 3.0% |
5 1.9% |
19 4.0% |
9 12.3% |
8 7.6% |
25 8.1% |
· |
25 5.6% |
93 5.2% |
|
산계자
|
· |
· |
· |
· |
2 2.7% |
14 13.2% |
43 13.9% |
6 18.2% |
84 18.9% |
149 8.3% |
| 계 |
3 4.5% |
2 6.0% |
38 14.3% |
138 29.4% |
33 45.2% |
48 45.3% |
150 49.2% |
19 57.6% |
185 41.6% |
618 34.4% |
| 기타 |
· |
2 6.1% |
1 0.4% |
6 1.3% |
1 1.4% |
· |
· |
· |
· |
10 0.5% |
| 합계 |
66 100% |
33 100% |
265 100% |
469 100% |
73 100% |
106 100% |
309 100% |
33 100% |
445 100% |
1,799 100% |
그러면 음관으로 초입사하는 수는 얼마나 될까? 사실 이 숫자의 계량화는 관련자료의 미비로 불가능하다. 다만 조선 후기 자료인
『음안(蔭案)』을 분석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자료의 통계를 통해서 보면, 음관 초입사자는 순조년간 20.0명,
헌종년간 37.8명, 철종년간 43.9명이었다. 그런데 연평균 문과합격자수는 태조-성종대에는 17.6명, 선조-고종대에는 34.6명이었다.
조선 후기 자료의 결과를 통해 조선 초기의 사정을 유추 해석하는 일이 얼핏 무망해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그리
지나친 일도 아니다. 어쨌든 위의 양 결과를 근거로 상호 비교해 보면, 조선 초기에도 음관 초입사자가 문과합격자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표 2>에서와 같이, 문과급제자 중 음관 전력자를 제외하면 그 양상은 더욱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조-성종대에 문과 총합격자수 1,799명 가운데 원유계자(元有階者)는 618명으로서 34.3%를 차지한다. 이들 원유계자
가운데에는 동반관직자가 60.8%인 376명이었으며, 이들이 곧 음관으로서 총합격자수의 20.9%를 차지하고 연평균 3.7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 문과 합격자 가운데 음관을 제외하면, 연평균 문과합격자수는 13.9명으로 감소하여 음관 초입사자수의 상대적
증가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문과합격자 전력(前歷)의 문제이다. 음관 가운데에는 문과 응시 때 전력을
유학이나 생원· 진사로 기록한 사례가 꽤 나타나 있다. 『음안』을 통해 보면, 161명 가운데 34명이 그러한 사례로서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19세기만의 사정인지, 아니면 조선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실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초입사자수의 다소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줄 수 있는 근거로 또 들 수 있는 것이 고위관료 역임자수이다. 실록에는 2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관원의 졸기(卒記 ; 태조 원년-성종 25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초입사자수의 다소를
유추할 수 있다. 졸기의 인원 553인 가운데 문무관은 233명(42.1%), 음관은 100명(18.0%), 기록불명자가 220명(39.8%)이었다.
아마도 기록불명자는 거의 대부분 음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음관은 무려 320명으로서 57.8%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문관 중심의 관료사회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결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것은 곧 그 당시 관료사회에서 음관의 비중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서 간접적으로나마 초입사자수에 있어서도
음관이 문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어떤 연구에 의하면, 태조-성종대에 필요한 동반실직의 인원이 8,029명인데, 문과합격자는 1,799명밖에 안되어 그들의
동반실직 점유율이 22.4% 정도라는 것이다. 동반실직 가운데 무관이 극소수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0% 이상은 음관이
차지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따라서 음서제는 실제에 있어서 조선 초기에 관료충원의 주요 통로였으며, 이를 통해 입사한 음관들은
관료구성의 기층을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음관의 초입사직은 참봉과 의금부낭청, 별좌와 찰방 등이 있었다. 별좌류는 무록관으로서 선초부터 음자제의 초입사직으로 활용되었으며,
찰방(察訪)은 봉명사신(奉命使臣)의 기능에서 역참관리 직임으로 일원화 되면서 세조 초에 음직화 하였다. 세조 3년에 신설된
선전관(宣傳官)도 음자제의 입속을 허용하였으나, 서반직으로서 음관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음관의 성장은 초입사직의 확대를 가져왔다. 인조 11년 최명길의 관제개편 내용에 의하면, 음관 초입사자수는 경외의
참봉 70원, 금부도사 10원, 별좌 29원, 선공감역 6원, 동몽교관 4원, 내시교관 2원, 수운판관 2원, 찰방 27원
등이었다. 중종 18년에 지적된 4개의 관직에서 크게 늘어난 숫자이다. 음관의 초입사직의 증가는 문관의 인사가 적체되는 역현상을
야기시켜, 이조판서 최명길에 의한 관제개편이 단행되었다. 또한 무인의 출사로를 확대하기 위해 음관의 입사연령을 생원· 진사는
30세, 유학은 40세로 제한하는 한년입사법(限年入仕法)이 제정되었다. 한편 음관 초입사자수의 확대는 음관 자신들의 승진상의
적체를 야기시켜 숙종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관제개편이 시도되었다.
음관에게 제한되었던 일부 주요 당상관직도 서서히 개방되었다. 관찰사나 곤수에 임명되었다든가, 정조 20년에 이성보를 예조참의에
임명하였으며, 경연 특진관, 도승지, 보국숭록대부 등도 허용하였다. 『해동관품록』을 통해 음관이 진출할 수 있는 관부를 살펴보면,
의금부, 중추부, 돈녕부, 호· 형· 공 삼조, 한성부, 도총부, 승정원, 오위장청 등에는 최고위직 진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유일에게는 의정부, 이조, 사헌부 등에 진출의 길을 허용하였다. 정종4품과 정5품은 정랑직 외에 대부분 문관직인 청요직인데,
이중 일부 관직에 유일이 참여할 뿐 음관의 해당 관직은 종친부의 전첨(典籤, 정4품)· 전부(典簿, 정5품)가 있다. 종5품에
이르러서는 판관(判官)과 능(陵)· 전(殿)· 부(府)· 서(署)의 령(令)에 음(蔭) 대신 생진(生進)으로 표기하여 음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판관과 령에서 정5품의 호· 형· 공 정랑직으로 천전하였다가 지방직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리고
6품 이하의 관직은 출신에 구애 없이 진출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음관이 장악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던 경리청· 선혜청· 장용영 낭청에도 음관이 배치되어 그들의 정치적 역할과 성격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임란 이래로 계속된 문· 음관의 적체는 정조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변통책을 동원하여 해소시켜 보고자 하였으나, 인사의 경색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정조는 문관의 질적 저하와 자질 부족을 탓하며 음관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음관은 관직
분포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었다.
지방 수령직은 교차과가 단일화 되면서 음과(蔭?)가 크게 증가하였다. 정조 12년에 지방관의 현황은 팔도 각읍의 수령 자리가
모두 332개인데, 무과가 90과, 음과가 179과, 문과가 단지 43과이고, 문무교차과까지 합치더라도 문과는 70과에 못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여지도서』 당시의 현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과는 103개에서 179개로 무려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무과는 56개에서 90개로, 문과는 30개에서 43개로 증가하여 문과는 음과와 무과의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삼반의 수령직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교차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육안』을 분석해 보면, 『여지도서』상의
교차과 140개가 23개로 축소 정리되어 거의 일원화되어 갔다. 정조년간 이래 어느 한 출신으로 단일화 되는 수령직의 삼반관직체제를
갖추어 갔던 것이다.
19세기 전반기의 음관에 대해서는 『음안(蔭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음안』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천· 지· 인 3책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책은 음관의 인사대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된 한 인물의 이력을
살펴보자.
| 金左根 |
老 景隱 丁巳 己卯進癸未十月司正承候侍直十二月副率乙酉八月饔主六品調用承傳九月戶佐丙戌二月典簿六月金化丁亥十月特高陽換戊子八月喪辛卯二月翊衛特典簿換六月延安壬辰四月喪甲午七月果八月衣僉乙未十二月饔僉丁酉九月咸判
登科 |
| 김좌근: |
노론, 자는 경은, 정사생.
기묘년 진사, 계미년 10월 사정, 승후로 시직, 12월 부솔, 을유년 8월 사옹원 주부「6품으로 조용하라는 왕의 명령」, 9월 호조좌랑,
병술년 2월 전부, 6월 김화군수, 정해년 10월 특별히 고양군수에 제수하였다가 상환함, 무자년 8월 상을 당함, 신묘년 2월 익위,
특별히 전부에 제수되었다가 상환함, 6월 연안군수, 임진년 4월 상을 당함, 갑오년 7월 사과, 8월 상의원첨정, 을미년 12월 사옹원
첨정, 정유년 9월 함흥판관, 문과급제. |
이 사례와 같이, 『음안』에는 음관의 이력이 날짜순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음관의 실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다음은 이 『음안』을 분석한 내용이다.
조선 후기 음관의 전력은 생원과 진사, 유학이었다. 실제 『음안』상에서도 양자가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음관의 초입사 연령은
14세부터 90세까지 거의 전 연령층에 걸쳐 있었다. 본래 초입사 연령은 생진이 30세, 유학이 40세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적장(嫡長)이나 사손(祀孫)에 대한 조용(調用)이 연령제한 없이 활성화된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생진과 유학 사이에는 차이를 보여 초입사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생진이 30대, 유학이 40대이었다.
초입사시기는 1784년(정조 8)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893년(고종 30)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음관 초입사자수는 문과급제자의 연평균인원 34.6명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미비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순종·
고종년간은 각각 20.0명과 19.9명인데 반해, 헌종· 철종년간의 37.8명과 43.9명이 실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에는 음서제가 관료충원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겠다.
음관의 거주지는 조선 후기의 지역 편중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음관 1,214명 가운데 서울이
822명이며, 경기도 125명, 충청도 154명, 전라도 16명, 경상도 58명, 강원도 40명, 황해도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기호지방이 전체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차별받았으며, 북방삼도는
아예 음관 등용이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음안』에는 당색이 명기되어 있어 당색별 임용 실태를 알 수 있다. 19세기 전반기는 노론계 외척세력이 정국을 전횡하던 시기로
여전히 당색은 정치활동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색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색의 구성현황을
보면, 노론과 소론이 압도적이며 남인과 북인, 오인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론과 소론으로서 30명 이상의 음관을 배출한
각 성씨의 성관을 보면, 노론계로서는 전주이씨 125명, 연안이씨 39명, 한산이씨 51명, 덕수이씨 30명, 광산김씨
58명, 안동김씨 102명, 대구서씨 42명, 청송심씨 42명, 은진송씨 35명, 평산신씨 30명, 남양홍씨 50명 등이다.
소론계로는 전주이씨 48명, 동래정씨 47명, 반남박씨 41명, 풍양조씨 38명 등이다. 세도정치기의 대표적인 문벌로는
안동김씨를 비롯하여 대구서씨, 풍양조씨, 연안이씨, 풍산홍씨, 반남박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문벌은 음관배출에 있어서도
우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들 성관 출신의 음관들은 특정 가계를 배경으로 하여 가문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다.
음관의 초입사직은 참봉· 별좌· 찰방· 의금부도사· 선공감역· 동몽교관· 내시교관· 수운판관· 가감역· 세마 등이었다.
『음안』에서의 초입사직 구성을 살펴보면, 참봉이 60%, 가감역 20%, 도사 8.5%, 동몽교관 5.9%로서 이들 4개
관직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음관이 초입사하여 출륙하기까지는 4년 이내가 53.8%였다. 그리고 5년 이내는 73.3%였다.
참봉의 출륙이 사만 3년 10개월이었으니, 초입사자의 절반 정도는 정상적이거나 조금 빠른 출륙이 이루어졌다.
음관의 최종관직은 각 성관별로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숫자가 수령직에서 치사(致仕)하고 있다. 경관직으로는 당하관과 당상관의
비율이 성관마다 차이가 있다. 이씨와 김씨를 표본으로 분석해 보면, 경관직 중 당상관은 25.0%로서 1품의 영돈녕과 판의금에
오른 인물도 있었다. 당상관 거의 대부분은 70· 80세를 거치면서 가자되어 돈녕도정이나 삼조 참의· 참판, 동· 지의금,
첨중추 등을 역임하였다. 다수가 돈녕도정에 제수되는 사례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돈녕부의 성격에 따라 왕실과 외척관계를
맺고 있거나, 국왕의 측근인 시종신(侍從臣)의 부조(父祖) 혹은 노인에 대한 예우차원의 수직(壽職) 가자를 통해 제수되었다.
당하관은 육조속아문의 실무관서로서, 음관들의 관료로서의 성격은 대민지배의 정치일선에 머무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음관은 정치적 성격이 미약한 주변부에 위치하였으나, 관료의 정치적 성격상 정권을 안정적으로
지탱시켜 주는 정권안보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관의 문과합격자는 『음안』상에서 161명에 달하고 있는데, 헌종년간 36명, 철종년간 56명, 고종년간 69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약 21.1%인 34명은 좌랑이나 목사 등의 전직을 놔두고 유생의 칭호로 전력을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가 이전 시기에도 벌어졌다면, 문과방목의 분석과 연구는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음관의 식년시 합격자는 11.8%인 반면, 별시 합격자는 88.2%였다. 별시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이 서울 거주자로서
별시의 설행에 관한 신속한 정보수집이 용이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음관의 문과 합격자 중 서울 거주자가
74.8%이며, 기호지방까지 합하면 91.2%에 달한다. 음관의 등과 당시의 연령은 문과급제자 전체의 평균연령이 철종년간으로
올수록 낮아지는 추세와는 반대현상을 보였다.
음관의 지방관 진출은 『여지도서』에서 전국의 군현 331개 가운데, 음과(蔭?)는 103개로서 문과(文?) 30개, 무과(武?)
56개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문무교차과(文武交差?)와 문음교차과(文蔭交差?)는 각각 59개와 61개이며, 문무음교차과(文武蔭交差?)는
18개로서, 이를 이분 혹은 삼분하여 각 과에 포함시켜 보면, 음과는 139.5개, 문과는 96개, 무과는 91.5개이다.
이때에는 음과가 다른 과보다 50%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관이 수령으로 진출한 지역은 충청도와 경상도가
가장 많다. 군사 요충지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지역은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로
갈수록 음과는 점점 증가하면서 교차과는 단일화 되어 갔다. 정조 12년의 지방관 현황을 보면, 332개 가운데 무과가 90개,
음과가 179개, 문과가 43개, 문무교차과가 20개로서, 음과와 무과는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문과는 그에 못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교차과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지도서』와 『백육안(百六案)』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교차과 등이 음과로 바뀐 사례가 70과였다. 따라서 음과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수령직이 삼반관직체제로 고정화 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처럼 임란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사림들은 스스로 문벌화 되어 갔다. 문벌은 곧 혈연을 매개로 한 관직승계가 관행화됨으로써
형성되는 가문 중심의 비조직체계였다. 주자가례의 보급에 의한 종법제도의 정착으로 사상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음관의
임용은 이미 문벌화 된 지배층의 자제들과 집권당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자파 인물의 전유물이 되었다. 혈통과 집권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음관의 정치적 위상은 당쟁이 계속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문이나 집권정치세력의 성쇠와 음관의 정치적·
관료적 위상과의 관계는 음관의 속성상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음관의 성장은 관료제의 변칙적 운영에 바탕한 것이었다. 공개 경쟁인 과거시험 출신들이 우대되지 못하고 가문을 배경으로
형성된 벌열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인사의 경색과 관료제의 침체를 야기하였다. 그에 따라 음관은 집권층의 정권적 안보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관료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도정치기에 극성을 이루다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양반지배층의
가문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은 『삼반세표(三班世表)』· 『삼반팔세보(三班八世譜)』 등의 보첩류가
유행처럼 만들어진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조선 말기 음관과 관련된 보첩류에는 삼반팔세보(문보, 무보, 음보) 중의 하나인 『음보(蔭譜)』와 『삼반세표』, 『문음진신보』,
『조선과환보』 등이 있다. 『음보』는 삼반(三班) 중의 하나인 음관의 보첩이다. 상하 2책으로 된 필사본으로서, 판심에는
삼반팔세보라 되어 있고, 표제명은 음보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음관의 개인별 가계를 성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 놓은 종합보로서의
성격을 띤 팔세보이다. 음관인 본인을 기점으로 직계의 8대 조상을 하단에 차례대로 기록하고, 그 아래에 외조와 처부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한 면의 세로줄은 11칸이며, 가로줄은 5칸이다. 제일 첫째 칸에 본인의 신상, 즉 이름을 쓰고 그 왼편에 자(字),
출생년(간지), 초입사년(간지), 초입사직을 기술하고, 그 아래 칸부터는 이름과 출신, 최종관직, 시호 등을 기록하였다.
초입사직은 齋(齋郞, 陵參奉), 部(漢城 五部 都事), 敎(童蒙敎官) 등 약자로 표기하였다. 장서각본은 서문이나 발문 혹은
간기가 없어 편찬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수록인원의 상당수가 『음안』에 등재되어 있어 대충 편찬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