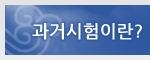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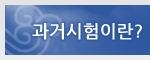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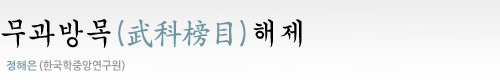 |
||||
|
|
1) 무과방목의 특성
방목은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부로서 과거급제자에 대한 1차 자료다. 조선시대에 문·무(文武)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여겨 무과가 시행된 이후부터 문과와 무과는 한쪽을 시행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함께 실시하였다. 하지만 과거급제자 명부인 방목의 간행은 문과와 무과가 서로 달랐다. 문과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전원을 집성한 종합방목이 남아있어 현재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급제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문과의 대거(對擧)로서 함께 실시한 무과는 상대적으로 사료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무과방목은 ‘호방(虎榜)’이라고도 한다. 무과방목은 현재 과거시험이 행해질 때마다 1회분(回分)의 과거급제자를 수록한 방목만 남아있다. 그것도 무과방목 단독으로 되어있지 않고 앞쪽에는 문과방목, 뒤쪽에는 무과방목을 실은 ‘문무과방목’의 합본 형태이다. 그래서 이 문무과방목을 ‘용호방(龍虎榜)’이라고도 하는데 용(龍)은 문(文)을, 호(虎)는 무를 의미한다. 예컨대 표제(表題)에서 「○○문과방목」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무과방목이 함께 들어있다. 예컨대 《경자식년문과방목》(1660년)은 겉장의 제목을 ‘경자식년문과방목’이라 했지만 ‘부무방(附武榜)’이라 하여 무과방목이 함께 수록되었다. 문무과방목을 문과방목이라고만 호칭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숭문천무(崇文賤武) 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전하는 무과방목은 엄밀하게 ‘문무과방목’이라 불러야 하나, 체재가 문과방목과 무과방목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무과방목’이라 호칭하였다. 그런데 무과방목이 문과방목과 함께 묶여 간행되었다 하여 두 방목의 체재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점 때문에 무과방목의 체재와 내용을 살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문무과방목은 문과방목이 앞부분에 있는데다가 문과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간행되었으므로 기록이 문과 위주로 서술되었다. 예컨대 시험 실시에 관한 전교(傳敎)나 계사(啓辭), 전시시일(殿試試日), 방방일(放榜日) 등은 문과·무과의 공통 사항이지만 문과방목 쪽에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문과방목 쪽에 실려 있으나 문·무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무과방목의 수록 내용으로 파악했다. 둘째, 무과방목은 조선시대 전 시기를 망라하는 종합방목이 없고 교서관이나 개인에 의해 1회분씩 간행된 방목만 남아있다. 이 때문에 누가 간행했느냐에 따라 부록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 국가에서 간행된 방목은 부록의 내용이 풍부하며, 개인에 의해 간행된 방목은 자료 수집의 여건이 좋지 못하므로 자연히 부록의 내용이 소략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문과방목과 무과방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합격증을 필요로 하고 공적(公的)으로 기록이 명확해 쉽사리 위조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이력이었다. 더구나 조선후기에 각종 문서에서 가문이나 직역(職役)이 위조되기도 한 상황에서 과거 급제와 같은 정확한 이력은 개인의 출신 배경을 잘 드러내는 지표와도 같았다. 그래서 과거급제자를 담아놓은 방목은 개인의 사회적 위상을 측정할 때 높은 공신력을 담보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무과방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과방목은 현재까지 무과급제자를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무과방목마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과방목은 다른 과거시험의 방목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방목의 작성과 간행
과거 시험이 끝나면 출방(出榜:합격자 발표)과 방방(放榜:합격증[紅牌] 수여)을 위해 방목이 작성되었다. 최종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이 방목은 시관들이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과방목해제>(원창애)에 자세하므로 이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시관에 의해 작성된 방목은 이후에 정식으로 판본으로 간행되었고, 필사본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방목의 간행주체는 중앙 정부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교서관(校書館)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교서관에서 간행한 문무과방목은 예조와 병조에 각각 보관되었고, 이밖에 사고(史庫)나 의정부·성균관 등에도 보관하였다. 그런데 급제자들에게 교서관에서 간행한 방목을 반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일 경우에만 반포하였다. 예컨대 1765년(영조41)에 실시한 식년시의 《을유식년문무과방목》은 교서관에서 간행하여 과거 합격자에게 나누어주었다. 영조가 직접 지은 서문[御製序文]에 따르면 본인의 생전에 을유년을 두 번 맞이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1784년(정조8)에도 정조는 왕세자책봉을 축하하는 과거를 실시한 후에 방목을 간행해 문·무과 급제자 전원에게 반포하였다. 이처럼 방목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국가에서 방목을 나눠주기란 쉽지 않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개인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째,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직접 방목을 간행했는데 주로 문과 급제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둘째 후손들에 의해 방목이 간행되거나 중간(重刊)되기도 하였다. 먼저 과거급제자가 직접 방목을 간행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546년(명종1) 식년시의 문과 장원급제자 심수경(沈守慶)은 같은 해에 실시된 문과·무과·중시문과·중시무과·역과·음양과·율과의 급제자 총 147명을 전부 합해 방목 한 권으로 만들어 각기 간직했다고 술회했다. 1) 개인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 수집과 경비였다. 개인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는 방중색장이 단자(單子)를 거두어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무과 급제자들은 방방식·사은례·알성례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함께 했고 단자도 이 무렵에 거두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임시로 초방(草榜)도 만들어 두었다. 만약 시험이 끝난 후에 단자를 거두지를 못했다면 방목을 간행할 무렵에 단자를 수합했다. 세월이 흘러 단자의 수집마저 여의치 않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목의 여러 서문이나 발문에 따르면, 무과급제자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조에 비치된 방목을 베껴내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방목에 소요되는 경비는 급제자 가운데 몇 몇 사람이 부담했고 또 급제자들에게 모금해 마련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이 방목의 간기(刊記)에 대한 해석이다. 《갑신별과방목》(1764)의 간기는 ‘숭정삼경인윤오월강도개간(崇禎三庚寅閏五月江都開刊)’이. 1770년 윤5월에 강도부에서 간행했다는 뜻이다. 이 시험이 강도부에서 특별히 실시한 별시이며 간기 역시 강도부에서 찍어냈다고 하므로 강화부가 주체가 되어 방목을 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방목은 문과 장원 유택하가 동년(同年) 정택서·윤임형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간행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정사알성별시문(무)과방목》(1677)이 있다. 이 방목의 간기는 ‘세신유호남아사권군경간우전주(歲辛酉湖南亞使權君敬刊于全州)’다. 간기에 보이는 권지(權持)[字 君敬]는 이 시험의 문과급제자로서 전주부 도사[亞使]일 때 주도해서 방목을 간행하였다. 따라서 간기가 지방이나 감·병영으로 되어있을 때 지방 관아에서 방목을 펴냈다고 여겨왔으나 그보다는 그 지역에서 방목을 찍어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방목 간행에 드는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방목 간행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과거급제자가 출사한 관아 명칭이 간기로 남게 되는 것이다. 방목이 후손들에 의해 간행될 때에는 방목을 새로 간행하거나 중간(重刊)하는 경우다. 새로 방목을 간행한 사례로 급제자의 아들이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의 동년(同年)들과 함께 간행한 《옹정오년정미윤삼월증광별시문(무)과전시방》(1727년)이 있다. 후손들이 방목을 중간한 사례는 원래 방목이 유실되어 다시 간행한 《만력십일년계미구월초삼일별시방목》(1583년)이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무과방목의 간행은 교서관이나 개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교서관에서 간행한 무과방목은 병조 및 관련 부서에 보관되었고 급제자에게 개별적으로 반포되는 사례는 특별한 은전이었다. 이 때문에 방목을 소장하기 위해 급제자들은 동년끼리 자료나 경비를 추렴해 방목을 작성하였다. 방목 간행을 주도한 과거급제자는 물적·인적 소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 1) 초시방목·복시방목
방목은 과거 시험의 합격자 명부로 과거시험이 실시될 때마다 만들어졌다. 무과방목 역시 다른 과거시험과 마찬가지로 무과의 실행 횟수만큼 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무과시험은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방목도 초시방목·복시방목·전시방목이 각각 만들어졌다. 현재 무과의 초시방목은 5종정도 남아있다. 《하동도회합이경증광무과별시초시입격인방목성책》(1783), 《가경십년구월일함경남도홍원현도회증광별시무과동당시취입격인방목시수병록성책》(1805), 《도광이십팔년시월평안도청남평양도회경과정시초시입격인방목성책》(1848), 《충청우도공주목도회알성무과초시입격거자방목성책》(1851), 《(함경)남도북청부정도회경과정시무과초시시취입격인등사조성책》(1852) 등이다.
무과의 초시방목은 2차·3차 시험인 복시·전시가 서울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서울로 보내졌다. 1553년(명종8)의 「과거사목(科擧事目)」에 따르면 각도의 문과·생원진사시의 향시(鄕試)는 방목을 4부 작성해 1부를 감영에 보내고, 3부를 예조·사헌부·사관(四館)에 나누어 보내도록 했다. 초시방목을 서울로 올려 보내는 이유는 복시나 전시에 나갈 사람을 정확하게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거사목」에 무과가 빠져 있지만 무과의 초시방목도 복시나 전시를 위해 서울로 올려 보냈다고 판단된다. 무과는 복시방목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과 복시를 치른 1소와 2소에서 방목을 올렸다.(武科覆試一二所 進榜目)’ 3) 라고 하듯이 복시방목이 만들어졌음이 확실하다. 또 문과에 《가정사십년갑자구월일문과복시방목(嘉靖四十三年甲子九月日文科覆試榜目)》(1564, 충남대)이 남아있으므로 무과도 복시방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식년시·증광시에서 복시가 시행되었으므로 초시·전시방목에 비해 숫자는 적겠지만 앞으로의 발굴을 기대해본다. 3) 전시방목
보통 ‘방목’이라 하면 대부분 과거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부인 전시방목을 지칭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현전하는 무과방목의 수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무과방목의 목록은 <부표>에 상세히 밝혀놓았다.
현전하는 무과방목의 시기별 현황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남아있는 무과방목이 드문 편이며 대부분 17~1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단종을 제외하고 태종~연산군까지의 무과방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숙종·단종·인조대의 무과방목이 30% 이상 남아있으며 현종·효종·경종·선조·정조대의 무과방목도 20% 이상 남아있다. 또 순조 이후로 현전하는 무과방목이 적은 편이며 의외로 현대와 시기가 가장 가까운 철종·고종대의 무과방목이 희소한 실정이다. 참고로 현재 가장 오래된 무과방목은 1453년(단종1)의 방목이다. 이 방목은 거창의 초계정씨 가문에서 전래된 「도광정사진사방(宣光丁巳進士榜)」의 이면(裏面)에 있는 고려의 국자감시(國子監試) 정사년(丁巳年) 방목의 하단에 실려 있다. 이 방목은 책자 형태가 아닌 다른 방목의 하단에 실려 있으나 조선시대 무과급제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명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된 무과방목 중에는 문집이나 기타 자료에 남아있는 것도 있다. 안정복(安鼎福)의 《잡동산이(雜同散異)》에 수록된 「정덕기묘사월천거별시문무과방목」(1519년)과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 수록된 「친림우모화관문무과정시별시방목」(1795년)이 그것이다. 특히 「정덕기묘사월천거별시문무과방목」은 중종 14년[己卯年]에 실시된 현량과(賢良科)의 방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다. 문과는 1519년 12월에 파방(罷榜)되었다가 1545년(인종1) 6월에 복과(復科), 1545년 10월에 파방, 1568년(선조1)에 복과되는 수난을 겪었다. 반면에 무과는 처음부터 파방되지 않았다. 당시 무과급제자는 장원급제자 정린(鄭璘)을 포함해 총 46명이다. 기재 내용은 일반 방목에 비해 소략해 급제자 본인의 전력·성명과 아버지 직역·이름만 기록되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무과방목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무과방목은 801회의 무과시험 중 138회분(17.3%)만 현전하고 있다. 무과방목은 다른 과거시험의 방목에 비해 남아있는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마저 전체 실행 횟수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과방목의 수집과 발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조선시대 법전에서 무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급제자'였다.(《경국대전》 권3, 예전 홍패식(紅牌式) "紅牌式 敎旨具官某文科<武科則稱武科>某科<稱甲乙丙>第幾人及第出身者")
3) 《철종실록》 권7, 철종6년 3월 신사 ; 《일성록》 326책, 고종25년 3월 28일(서울대학교, 1982, 76책 231나). 4) 목록에는 '문무과방목'으로 되어있지만 합격자 리스트가 없는 방목이 3종 있다. 《숭정삼갑인춘자전흡제오순자궁흡제육순합이경경과정시문무과방목(崇禎三甲寅春慈殿恰?五旬慈宮恰?六旬合二慶慶科庭試文武科榜目)》(1794), 《숭정기사동황태자탄생별시문(무)과방목(崇禎己巳冬皇太子誕生別試文(武)科榜目)》(1629), 《정덕기묘사월천거별시문무과방목(正德己卯四月薦擧別試文武科榜目)》(1519)이다. 또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hollis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면 목록은 나오나 도서관에서 실제로 찾을 수 없는 방목이 2종 있다. 《천계칠년정묘식년문(무)과방목(天啓七年丁卯式年文(武)科榜目)》(1627)과 《숭정십오년임오식년문(무)과방목(崇禎十五年壬午式年文(武)科榜目)》(1642)이다. 1) 무과 급제자에 대한 내용
무과방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무과급제자에 대한 기록으로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 무과에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무과급제자는 등수에 따라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로 나누어 기재되며 인적 사항은 합격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직부전시·최종관직 등 기타 사항을 기록하였다. 무과방목의 기재 내용은 방목마다 일정하지 않고 시기별로 변화가 있다. 15세기의 무과방목은 매우 간략하게 본인의 전력과 성명만 기재되었다. 16세기 중·후반이 넘어서야 본인의 생년간지나 본관·거주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내용도 풍부해진다.(1) 본인
급제자 본인에 대한 기재 사항은 기본적으로 무과에 응시할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전력, 성명, 자(字), 생년간지(곧 나이), 본관, 거주지가 있다. 현전하는 15세기 방목에는 급제자 본인의 전력과 성명만 기재되었고, 16세기 중·후반이 넘어서야 생년간지나 본관·거주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직접 기재한 방목도 있는데 대부분 무과급제자가 많이 배출되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무과방목에서 나타난다.다음으로 급제자에 대한 사항에서 주목되는 기록이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표시다. 직부전시는 무과의 절차인 초시나 복시를 면제하고 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시는 과거시험의 최종 단계로서 시험의 당락과는 무관하며 초시나 복시에서 올라온 합격자의 합격 순위만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직부전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과 합격이나 다름없었다. 현전하는 무과방목 중 직부 표기가 처음 보이는 무과방목은 1603년 식년시다. 직부전시의 표기는 보통 무과급제자 성명 위에 '직부(直赴)' 또는 '직(直)'을 기록해 나타냈다. 반대로 법제적으로 규정된 무과 시험의 절차(초시·복시)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원(元)', '원일소(元一所)' '원이소(元二所)'로 표시해 나머지 급제자들이 직부전시로 합격했음을 나타냈다. 6) 또 '직부'라는 직접적인 표시는 없지만 방목 끝에 '원방이십팔인 직부이백칠십이인(元榜二十八人 直赴二百七十二人)'의 형식으로 원방과 직부 인원만 기재한 방목도 있다. 이 밖에 '갑오남한시재(甲午南漢試才)' '계사중순시재(癸巳中旬試才)'처럼 무과급제자가 언제 어떻게 직부를 받았는지 기재한 방목도 있다. (2) 가족
가족 사항은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이 기본이며, 부모의 구존 여부나 형제 이름을 적었다. 양자이면 생부의 관직과 이름을 추가하였다. 부모의 구존 여부는 구경하(具慶下:부·모 생존), 엄시하(嚴侍下:부 생존), 자시하(慈侍下:모 생존), 영감하(永感下:부·모 사망), 중시하(重侍下:조부모·부모 모두 생존) 또는 중경하(重慶下)로 구분하였다. 16세기 이후부터 부모의 구존여부나 형제가 기록되며, 형제의 경우 적서(嫡庶)를 구분해 기록한 방목도 있다. 또 무과 급제자의 가족 사항이 문과 급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한 방목도 꽤 눈에 띤다. 방목의 간행 주체가 문과 급제자이거나, 무과급제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미비 또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덕팔년계유방목』(1513)은 문과급제자의 경우에 어머니의 작호(爵號)·본관·성씨, 부인의 본관·성씨까지 기재하였다. 하지만 무과·잡과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기재했다. (3) 기타
1792년 식년시의 방목에는 합격자 끝부분에 '이하 9인은 사망한 사람으로 방목 끝에 붙인다.(以下九人身故人付榜末)'고 쓰고 급제자의 전력과 이름만 기재했다. 이는 전시에 응시하기 전에 응시자가 사망했으면 방목의 끝에 기록하고 홍패를 지급하라는 규정을 따른 조치였다. 7) 또 드문 사례로 '첨록<이하 16인은 방목을 수정할 때에 누락되었으므로 경연(經筵)하는 자리에서 아뢰어 덧붙여 기록한다.>(添錄<以下十六人榜目修正時見漏故筵稟添錄>'도 있다.(1784정시) 이 밖에 두주(頭註)에 '해과(海科)' '참급(斬級)' '참(斬)' '선(仙)' 등이 표시되거나 생년 간지 아래에 '복시장원(覆試壯元)'이 기록된 방목도 있다.
2)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시험 실시에 관한 내용은 무과방목의 앞뒤에 제목 없이 실려 있거나 '권수(卷首)', '부록(附錄)', '부편(附篇)' 등의 제목을 달아 수록하였다.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무과급제자에 대한 기록처럼 방목마다 일정하지 않고 시기에 따른 변화가 큰 편이다. 15~16세기까지는 무과방목에서 부록이 없는 방목이 대부분이다. 17세기 후반 이후에야 방목의 기재 내용이 풍부해지며 앞뒤의 부록도 많아지는 편이다. (1) 전교·계사
대신(大臣)이나 예조·병조에서 과거 실시의 건의, 시험일자·선발인원[試取人員數]·시험과목 등 시험 운영 및 절차에 대해 보고하는 계문(啓文)과 국왕의 전교(傳敎)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과거시험의 실시 배경이나 규정 등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전교나 계사는 급제자 명단을 기록하기 전에 방목의 가장 첫 부분에 실린다. 1662년 증광시를 시작으로 17세기 중반 이후에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18세기에는 자주 실린다. 특히 교서관에서 찍어낸 방목에는 대부분 들어있다. (2) 서문·발문
서문이 있는 방목은 1513식년시·1637정시·1706정시·1764강화도별시·1765식년시·1774등준시·1784정시다. 발문이 있는 방목은 1471별시·1583별시·1651별시·1637정시·1727증광시다. 방목의 서·발문에는 과거시험의 실시 배경이나 방목 간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3) 시관[恩門]
방목에는 은문(恩門)이라 하여 시험관의 직위·이름을 기록하였다. 방목 앞부분에 문·무과 시관을 나란히 기록하거나, 문과방목·무과방목에 각각 나누어 실었다. 전시의 시관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총 8원으로, 2품 이상의 문관 1원·무관 2원, 당하관의 문관 1원·무관 2원이 시험관을 담당했고,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원이 감시관(監試官)이 되었다. 8) 그리고 국왕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의정대신 1원을 명관(命官)으로 파견했다. 방목에는 대체로 2품 이상의 시관을 참시관(參試官), 당하관의 시관을 참고관(參考官)으로 나누어 기재했으며 시소승지(試所承旨)라 하여 승정원의 승지 한 명을 더 기록하였다. 인원은 7~10명 정도이며 5명일 때도 있다. 15세기 방목에는 은문에 대한 기록이 없고 16·17세기의 방목 역시 은문 기록이 드문 편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 은문에 관한 기록이 많아진다. 또 앞쪽에 실린 문과방목에는 은문이 있으나 뒤쪽의 무과방목에는 은문이 없는 방목도 있다. 은문 이외에 감독관(監督官), 시수집고관(矢數執鼓官), 집책관(執冊官) 등이 기록된 방목도 있다. (4) 방중색장(榜中色掌)
방중색장은 1630년에 처음 나타난 이후 드문드문 등장하다가 17세기 중반부터 대부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방중색장의 규모는 3~6명 정도이며 성명만 기재된다. 방중색장은 말 그대로 무과급제자 가운데 유사(有司)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 방회(榜會)나 무과방목 간행 등 동년(同年)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다. 9) (5) 전시일·출방일·방방일·사은일·알성일
출방(出榜)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며, 방방(放榜)은 국왕이 합격증[紅牌]을 수여하는 의식이다. 사은(謝恩)은 방방식 다음날 문·무과 급제자 전원이 궁궐에 들어가 임금의 은혜에 사례하는 의식이며, 알성(謁聖)은 문·무과 급제자 전원이 문묘(文廟)에 배알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행사 일자는 방목의 주요 기재 사항 중의 하나로 출방일만 제외하고 전시일·방방일·사은일·알성일은 문과·무과가 같은 날에 행해졌다. 17세기 중반 이후로 전시·방방식의 거행장소가 함께 기재되기도 한다.
(6) 시험 과목[規矩]
전시의 시험과목은 1649년 정시 무과방목에 처음 보인다. 내용은 “편전(片箭) 혁(革) 강서(講書)<삼재구입(三才俱入)>” 등 간략한 편이다. 각종 행사 일자와 함께 방목에 자주 보이는 사항 가운데 하나다.
(7) 시취인원(試取人員)·경외입격수(京外入格數)
방목에는 해당 시험의 급제자 총원(總員)을 기록하기도 한다. 기재 방식은 무과급제자를 원방(元榜)·직부인(直赴人)으로 나누어 각각 총원을 기록했다. 무과급제자 총수는 한성 및 지방의 합격자 총수를 기록한 경외입격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704년 정시 방목에 처음 보이며 주로 18세기 방목에 나타난다. 19세기에도 1801년 정시 방목뿐이다. 18세기 초에는 문과·무과 급제자의 총원을 나란히 기록했다가 1723년 별시부터 대부분 문과·무과가 따로 기재되었다. 또 경외(京外)를 한성과 8도로만 구분하다가 1725년 무렵부터 개성부·강화부를 별도로 분류했다. 한편, 경외입격수를 기록하면서 지방별로 원방·직부인을 나누어 기록한 방목도 있다. (8) 초시·복시 사항
1624년 증광시의 방목에 회시출방일(會試出榜日)이 처음 실린 이후 17세기 중반부터 자주 기재되었다. 18세기부터는 내용도 풍부해지며 19세기 방목에는 '부편(附篇)' 또는 '부록(附錄)'을 두어 초시·복시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초시나 복시에 대한 사항은 시험일[開場日]·출방일·시험장소[試所]가 주로 실리며 은문(恩門)·규구(規矩)도 기재되었다. 이외에 초시장원, 복시장원, 초시경외입격수, 초시·회시입격수, 초시 단자수(單子數), 각도경시관(各道京試官) 등도 실려 있다.
(9) 기타
형제가 같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방목 말미에 '연벽(聯璧)' '연중(聯中)' '쌍련(雙聯)'이라 쓴 후 형제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이밖에 전시단자수(殿試單子數)나 창고지기[庫直] 등도 나와 있다. 5) 이 장에서 논의하는 무과방목의 기재 사항은 현전하는 무과방목을 대상으로 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6) 《숭정삼계묘증광별시문무과전시방목》(1783). "文直赴 各以某年某科 標諸書頭 武直赴多 不能盡標 就原榜人 名上加原字以標之" 7) 《육전조례》 권7, 병전 병조 정색(政色) 무과. 8) 《경국대전》 권4, 병전 시취. 9) 《정축중시문무과방목》 발문. "今年秋 余膺萊州之命 同年朴來卿 以余爲榜中色掌 而又其邑力 足以印出榜目 辭陛之日 乃以草本見授 蓋來卿同爲色掌故也…" 1) 무과의 종류
조선시대에 무과가 처음으로 실시된 시기는 1402년(태종2)이었다. 문과는 이보다 앞서 1393년(태조2)부터 시행되었다. 1402년에 무과가 시행된 이후부터 문과와 무과는 ‘대거(對擧)’라 하여 한쪽을 시행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함께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 무과는 1402년 이후부터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가 폐지될 때까지 총 801회 시행되었다. 무과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식년시(式年試)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별시(별시)가 있다. 식년시는 3년 마다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들어가는 해에 실시하는 시험이다. 별시는 증광시를 비롯해 별시·외방별시·정시·외방정시·알성시·춘당대시·중시·도과·등준시·진현시·발영시·탁영시·구현과·충량과 등이 있다. 증광시는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했는데 식년시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다. 첫째, 선발 정원이 식년시와 같으며, 대증광시(大增廣試)에만 식년시의 두 배를 뽑도록 하였다. 둘째,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삼장(三場)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선조 대 이후로 증광시의 실시 이유가 다양해지지만 왕의 즉위 등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실시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넷째, 증광시는 식년시처럼 문과·무과·생원진사시·잡과 모두 공통으로 시행한 시험이었다. 반면 각종 별시는 문과·무과에만 있었다. 정시는 1489년(성종20)에 처음 시작될 때에는 봄·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에게 직부전시의 자격을 내리는 시험이었다. 이것이 1583년(선조16)부터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었고, 무과는 《국조방목》에 중종 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정시는 증광시를 설행할 만한 큰 경사는 아니지만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관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알성시는 국왕이 문묘를 참배한 후에 시행한 시험이며, 외방별시·외방정시·도과는 지방민을 위열하기 위해 특별히 실시한 시험이다. 중시는 10년에 한 번씩 당하관 이하 관리의 승진을 위해 실시한 시험이며, 등준시·진현시·발영시·탁영시·구현과도 중시와 성격이 비슷하다. 2) 시험 과목
무과는 기본적으로 초시, 복시, 전시를 거치는 삼장제(三場制)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식년시와 증광시를 제외한 각종 별시에서는 한번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단시제(單試制)나 강경이 있는 복시(覆試)를 생략하고 초시와 전시만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먼저 식년시의 시험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3) 선발 인원과 등수
식년시의 선발 인원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초시의 경우 총 190명을 선발하였다. 초시는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되었는데 서울에서 실시하는 훈련원시에서 70인을 뽑았다. 지방에서 실시하는 향시(鄕試)에서는 경상도 30인, 충청·전라도 각 25인, 강원·황해·함경·평안 각 10인씩 뽑도록 하였다. 이러한 초시의 인원 배정은 지역 할당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었고 삼남과 서북지방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였다.복시의 선발인원은 28인이며 전시에서는 복시 합격자 28인의 등수를 정하였다. 따라서 초시에서 선발된 사람이 최종 합격하기까지는 약 6.8ː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급제자의 등수는 갑과(甲科), 을과(乙科), 병과(丙科)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3명, 5명, 20명씩 배당되었다. 갑과 3인 가운데 1등을 장원(壯元)이라 한다. 증광시의 선발인원은 법제상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28명이었다. 다만 여러 경사를 많이 합하여 실시하는 대증광시는 초시·복시의 합격자를 식년시의 2배로 뽑도록 했으므로 10) 전시의 인원수가 식년시의 2배인 56인이 된다. 별시·정시는 《속대전》에 따르면 초시 액수는 왕에게 품지하고 전시는 초시 입격자 수에 따르도록 하여 구체적인 정원이 없었다. 알성시와 중시는 초시의 경우 두 시험장에서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뽑았으며 전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표3-10>과 같다.
4) 응시 자격
『경국대전』에 의하면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당하관 이하만 응시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의 조항은 관리들의 응시 자격을 제한했을 뿐이지 과거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조선전기 무과의 실제적인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한다. 먼저 문과와 달리 제한이 없어서 천인이 아닌 모든 계층이 응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반면, 훈련관(訓練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반자제를 주축으로 한 사족층, 관인층인 성중관(成衆官), 의흥친군위의 친군(親軍)·삼군갑사(三軍甲士) 등의 금군(禁軍)에 포함된 일부 상층 양인, 무직사관(無職事官)인 한량(閑良) 등 말과 하인을 데리고 무예를 익힐 수 있는 사족층을 주된 응시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 태종~성종연간 무과급제자 336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급제 당시 이미 관직 또는 품계를 받았거나 양반 특수 정예군 소속으로서 사족이 많으며, 이들의 아버지 역시 문반관료 혹은 학자성향의 인물이 대다수라는 연구결과가 있어 후자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선전기의 무과 응시자격을 둘러싼 논란과는 대조적으로 조선후기에는 『속대전』에서 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법제상 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