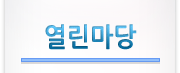|
오늘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부 기관의 주요 임명직에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오늘날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치의 관행인 양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살펴보아도 개국 초기에는 수많은 건국 공신들이 책봉되었다. 국가 제도가 안정된 후에도 문음(門蔭), 또는 음서(蔭敍)라는 이름으로 공로에 보답하는 인사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음서에 의해 뽑힌 관리를 음관(蔭官)이라고 하는데, 음관은 원칙적으로 장자 즉, 큰아들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자가 죽었을 경우 장손이나 다음 아들이 대신 그 직위를 받을 수도 있었다. 조선 초에는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손은 시험을 보지 않고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음서에 대한 법률 규정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매년 1월에 20세 이상 되는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를 선발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관직은 녹사 이상이었다.
하지만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해서는 이른바 청요직에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이 건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되면서 최고의 관직인 정승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의 급제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옛날에는 문관들이 모여 술 마시며 글짓기하는 모임인 문주회(文酒會)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음서 출신을 많이 따돌렸다.
오죽하면 음서 출신들은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을까? 그리고 과거 급제자 출신들은 자신들의 결속력을 이용하여 청요직으로 불리는 중요 관직에 음서 출신자들이 진출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후에도 다시 공부하여 문과를 보고 당당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뉴스가 오늘날도 자주 들리는데, 이러한 의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들 중상당수가 다시 과거를 보고 급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로 성공하는데 유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다시 과거를 보고 급제한 사례를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에서 찾아보자. 검색창에 “문음 & 급제”를 입력하거나 “음관 & 급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