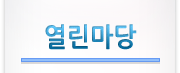|
우리는 과거합격자 하면 어려운 한자로 된 무언가 장중하고 근엄한 이름을 연상한다. 조선시대에는 대개가 양반만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경박하고 천한 듯 한 이름을 가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조선시대 무과 합격자 명단을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1637년 별시 무과 합격자를 보면, 안끝남(安唜男), 주얼동(朱於里同), 정끝동(鄭唜同), 옥글동(玉文里同)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당시 이같은 이름은 주로 평민들이 붙이던 것으로서 “마지막에 겨우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끝동이, “글을 잘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글동이라고 이름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를 보면서 이름을 한자로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끝”, “얼”, “글”은 해당하는 한자가 없어서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 전체를 수록한 국조문과방목에는 이와 유사한 이름들이 안 보이며, 주로 무과방목에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이름에서 보듯이 양반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합격한 1637년은 국토가 오랑캐에게 유린되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조정에서는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무인을 선발했고 무과 응시 자격을 양반의 범위를 넘어 평민에게까지 확대했던 것이다. 그 결과 양반과 평민을 포함하여 5,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번에 선발한 것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과거합격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1천명 이상 선발한 무과시험이 10차례나 된다. 더욱이 1676년(숙종 2년)에는 무려 17,652명이나 되는 무인을 선발하였다.
이 경우 무과는 단순한 무관 선발 시험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하층민이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듯, 전란은 출세의 기회를 제공했다. 역설적으로 전쟁이라는 극도의 혼란이 끝남이, 막동이, 끝새 같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는 숨통을 트였던 것이다.
|